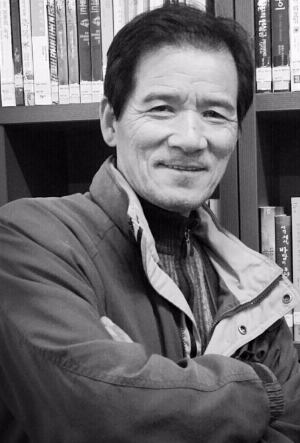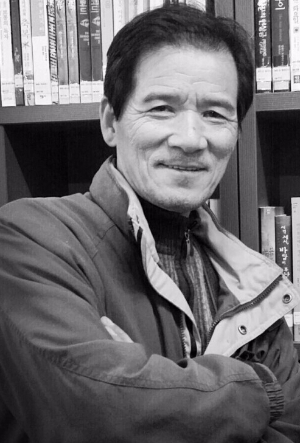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화살나무 가지에도 새순이 돋기 시작하고 초록 이끼에도 한결 생기가 돈다. 솔잎도 칙칙한 겨울빛을 지우고 한층 밝아졌다. 낙엽 사이로 삐죽삐죽 솟아난 원추리의 새싹들과 숲 가장자리 찔레 넝쿨에도 나란히 돋아난 연둣빛 새순들이 봄볕을 쬐고 있다. 산 밭머리에 연둣빛 새잎을 가득 달고 선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온다. 귀룽나무다. 다른 나무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새순을 틔우는, 숲에서 제일 부지런한 나무다. 옛사람들은 귀룽나무 잎이 나는 것을 보고 농사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단번에 눈길을 잡아끄는 것은 꽃샘바람을 이기고 피어난 봄꽃들이지만 연두는 우리의 가슴을 봄빛으로 물들게 한다. 이따금 서늘한 냉기를 품은 꽃샘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해도 꿈꾸는 듯 피어나는 연둣빛 새싹들을 보면 내 몸 어딘가에서도 연둣빛 움이 돋아날 것만 같은 착각마저 든다.
이미 거리엔 꽃의 물결이다. 백목련이나 산수유, 살구꽃, 앵두꽃은 이미 만개했고 담장엔 샛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졌다. 학교 담장 가 벚나무 가지에도 꽃망울이 곧 터질 기세이고, 자목련과 라일락도 꽃망울이 한껏 부풀었다. 이상 기온으로 올봄은 유난히 빨리 오는 듯싶다. 이렇게 세상의 꽃나무들을 흔들어 깨우며 다가오는 봄의 속도는 과연 얼마일까. 봄이 오는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봄꽃의 개화 시기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가령 웨더아이 발표 데이터상의 벚꽃 개화 시기를 보면 제주(3.22.)와 서울(4.3.)은 12일 차이가 난다. 이를 제주와 서울 간 거리인 453㎞로 나누면 하루 약 37㎞의 속도가 나온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학 현상)을 주제로 흥미롭게 풀어낸 'Zoom 거의 모든 것의 속도'를 쓴 천문학과 교수이자 과학 칼럼니스트인 밥 버먼도 다양한 식물의 꽃망울이 터지는 속도로 봄이 오는 속도를 계산했다. 이외에도 태양의 고도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별 차이는 없다. 측정 방법과 시기·지역에 따라 조금씩 속도는 달라지겠지만 대략 시속 1~1.5㎞로 봄은 움직인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속도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속도와 비슷하다.
갈수록 세상은 각박해지고 살아낼수록 삶은 점점 팍팍하기만 하다.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뜻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게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나는 사람의 거리를 벗어나 숲을 찾아 자연을 바라보곤 한다. 언뜻 보면 질서도 없고 제멋대로인 듯한 자연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자연만큼 질서 정연한 것도 없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식물들은 기다렸다는 듯 때맞춰 꽃을 피우고 잎을 내어 이내 숲을 초록으로 가득 채운다.
봄볕이 제아무리 따스해도 바람결엔 여전히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꽃샘바람 속에서도 봄을 읽어내고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아장걸음으로 다가오는 봄인데도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 할 수밖에 없다. 때맞춰 꽃을 피우고 새잎을 내는 초목들처럼, 그리하여 숲에 연두의 바람을 불어넣는 자연처럼 때를 알고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멋진 삶이 아닐까.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