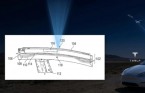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일례로 중국 톈치리튬과 호주 광산기업 IGO가 합작한 톈치리튬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Tianqi Lithium Energy Australia)는 지난 5월 호주 최초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 배터리급 정제공장을 설립했다.
기업들이 미·중 긴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망 개선 차원에서 나온 이번 제휴는 과거 호주의 리튬 광산기업들이 주로 하던 '채굴해 선적하기(dig it and shipping it)' 사업모델에서 탈피하는 의미를 가진다.
2021년 미국 지질조사국의 추정에 따르면 호주는 세계 리튬 생산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리튬 원료는 대부분 배터리 소재 최상위 프로세서인 중국으로 수출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 리튬 수요는 3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수준의 4배다.
영국 분석회사 CRU의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로일은 "채굴 광산 근처에서 자동화 장비를 갖춘 이 새로운 호주 공장들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비용 포지션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톈치 리튬에너지 호주의 크위나나 공장은 2만4000톤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 두 번째 공장이 건설 중이다.
톈치는 여러 국가에서 리튬 광산을 채굴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리튬 광석을 가공하고 있다. 간펑 리튬 다음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리튬 정제 회사 중 하나이다.
라즈 수렌드란 톈치리튬에너지 호주 최고경영자(CEO)는 "정제소는 톈치의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화학 가공 기술'과 IGO의 '배터리 금속 채굴 경험'이 결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중견 광산기업인 미네랄 리소스(Mineral Resources)도 배터리 소재 주요 공급사인 미국 앨버말과 제휴를 통해 리튬 제련에 뛰어들었다.
지난 7월부터 합작법인인 10억 호주달러(6억3000만 달러)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됐다. 알베말에 따르면 이 공장은 연간 약 5만 톤의 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큰 리튬 정제소 중 하나이며, 향후 그 용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 있다.
소매업으로 가장 잘 알려진 호주의 복합기업 웨스파머스(Wesfarmer)도 리튬 가공업에 뛰어들었다. 칠레 광업 대기업인 SQM과 제휴하여 2024년에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며 연간 생산량은 50,000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홀랜드산 프로젝트의 리튬 광석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크위나나 공장에서 정제될 것이다.
지정학적 요인이 호주산 리튬으로의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주로 서방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노출을 줄이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리튬 뿐만 아니다. 제너럴모터스(GM)는 호주 니켈업체에 투자했고 포드자동차는 영국계 호주 광산기업 BHP그룹과 배터리 금속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환경적 고려도 호주 리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한몫했다. 호주에 건설되고 있는 최신 정제 시설은 ESG 측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다운스트림 제조업체들은 공급망의 모든 부분에 ESG 목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 업체들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




























![[실리콘 디코드] 日 라피더스, '유리 인터포저' 공개…TSMC 아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21809292001056fbbec65dfb59152449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