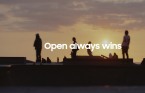18일 카멜자산운용에 독일이 유로존이 해체되지 않도록 도우면서 유로를 구할 경우 5790억 유로, 돕지 않고 방관할 경우, 유로존 붕괴시 독일은 1조 3000억 유로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7%가까이 치솟고, 그동안 안전지대로 분류됐던 독일과 영국의 국채금리도 오르기 시작했다.
EU는 단기적으로 유로존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마저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 오면 구제금융기금도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프랑스 등은 유로존이 현재의 통화동맹체에서 진전돼 은행동맹, 재정동맹, 유로본드 등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독일은 은행동맹과 유로본드에는 반대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빚까지 떠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차원의 은행 감독이 강화되려면 먼저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양보가 있어야 한다”며 은행동맹구축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7일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독일 국채의 안전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함영곤 연구원은 이날 주간금융브리프에서 유로존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가장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독일의 국채 또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
실제 올해 초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발행했던 독일의 국채금리는 스페인이 구제금융 수용을 발표한 지난 9일부터 급등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49%까지 올랐다.
독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치솟아 5월 말 1%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올해 최고치인 1.09%까지 급등했다.
여기 더해 독일 집권당의 입장으로서는 향후 선거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일 것이라는 견해다.
김지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8일 글로벌이코노믹와의 통화에서 “독일입장에서는 유로존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싶어도 향후 선거를 의식한 집권총리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며 “유로존 위기를 돕는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독일이 소극적 개입으로 인해 유로존 위기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하반기 국내증시상황도 불투명한 가운데 유럽의 상황을 관망해야한다는 결론이다.













![[현장] AI컴퓨팅 전력소비 줄이기에 '사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184&h=118&m=1&simg=2024041917582903842edf69f862c1182354136.jpg)














![[유럽 증시] 이스라엘 이란 타격에 유럽 3개국 지수 '동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1720184501291a6e8311f6421814790164.jpg)